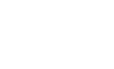광주 사적지(29개소)



광주는 1896년 나주에서 ‘관찰부’가 이전하면서 전라남도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전라남도청’이라는 명칭은 1910년 「조선총독부지방관제」가 제정되면서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전라남도청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혹은 위임을 받은 지방권력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도청을 대상으로 항거하는 것은 곧 중앙정부와 국가 권력을 향한 몸부림이었다.
비상계엄이 확대되자, 도청의 역할은 크게 위축되었다. 계엄군과 505보안부대, 중앙정보부 전남지부 등이 실질적으로 도정 전반을 장악했다. 계엄군은 도청을 중심에 두고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계엄군이 학생과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이 쓰러져도 도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계엄군은 진압작전을 같이 수행하는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5월 21일 오전 계엄군은 도지사를 내세워 시민들과 협상을 시도하는 도중에도 헬기를 이용하여 도청의 문서와 시신 등을 반출했다. 시민 대표들은 오전 8시 40분부터 10분간 수산국장실에서 도지사와 면담을 했다. 시민 대표들이 ‘군 투입과 무차별 구타에 대한 공개 사과, 연행 학생 및 시민의 석방, 금일 12시까지 공수단의 완전철수’를 요구하자, 도지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날 오후 계엄군은 집단발포를 했다.
계엄군이 도청에서 철수한 것은 5월 21일 오후 5시 무렵부터였다. 도청 상황실은 오후 4시 30분경에, 경찰 상황실은 5시 15분에 폐쇄되었다. 시민들은 계엄군이 물러났지만 한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일부 시민들이 도청 내로 들어갔으나, 시민이 실질적으로 도청을 접수한 것은 22일부터였다.
도청에는 임시학생수습학생위원회를 비롯해 순찰대, 시체처리반 등이 긴급 결성되었다. 시민군은 도청 내의 질서를 회복하고, 계엄군의 재진입과 공작에 대비했다. 시민군은 도청 1층 서무과를 작전 상황실로 사용했으며, 경찰과 계엄군이 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 등을 착용했다. 22일 부지사와 도청 간부 그리고 일부 직원이 출근을 했으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를 대신하여 학생과 민주 인사들이 만든 수습대책위원회가 각종 업무를 대행했다. 도지사는 그 시간에 상무대에서 신임 국무총리서리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잠시 후 국무총리서리의 호소문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다.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수립하고, 도청 재진입의 기회를 노렸다. 계엄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도청 회의실 지하에 보관된 폭발물이었다. 이것이 폭발하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했다. 계엄군은 24일 폭발 전문가인 군무원을 투입하여 폭발물의 뇌관을 제거했다.
계엄군의 진압작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청의 분위기는 전쟁 전야와 같았다. 항쟁지도부는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주요 장소들에 시민군을 배치했고, 도청 내에는 200여명이 남았다. 계엄군의 진압작전에는 47개 대대 20,317명이 동원되었다. 새벽 3시 30분에 시작된 진압작전은 5시 20분경 사실상 종료되었다. 계엄당국은 17명이 사망했고, 227명을 연행했다고 발표했다. 시민군의 시신들은 도청 본관을 비롯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생존자들은 양팔이 묶이거나 엎드려 있었다. 계엄군은 시민군의 등에 ‘총기소지, 극렬, 실탄소지’ 등이라고 썼다. 계엄군은 탱크를 비롯해 각종 차량을 앞세우고 도심 이곳저곳을 행진하며 위력시위를 벌였고, 상공에는 헬기가 선회했다.
현재 옛 전남도청 건물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16호)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치
주변 사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