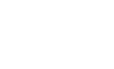광주 사적지(29개소)


홍남순(洪南淳)은 1912년 6월 7일(음력)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출생했다. 1946년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장에 취임했고, 194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활동하다 참전했으며, 1953년부터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을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1963년 10월 1일 광주시 궁동 15번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재 개업했다. 홍남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인권 변론을 맡아 광주ㆍ전남지역의 이른바 ‘어른’으로 큰 획을 그은 삶을 살았다. 그는 2001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하다가 2006년 10월 14일에 사망했다. 홍남순은 국립5ㆍ18민주묘지 제5묘역 76번에 안장되었다.
홍남순이 민주화운동과 인연을 맺은 계기는 “한일협정조인반대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64년 3월부터 6월일까지 전개되었던 “6ㆍ3항쟁”, 즉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이어 1965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분출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6ㆍ3항쟁으로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을 1965년 1월 18일에 속개하고 2월 15일에 한일기본조약 전문에 합의했다. 민의를 도외시한 정부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재야, 시민, 학생 등은 거세게 규탄했다.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월 16일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전남대학교에서는 3월 31일 총학생회 주최로 “매국외교 결사규탄성토대회”가 열렸다. 이제 막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홍남순은 이 위원회 전남지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시위 현장을 누볐다.
이후 그는 전남지역의 다양한 정치 현안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1966년 “호남푸대접 시정위원회”, 1967년 “6ㆍ8부정선거 전면 무효화 투쟁위원회”(위원장), 1969년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전남지부 위원장),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전남지부 대표), 1973년 ‘재야 지식인 15인 시국선언’, 1975년 “민주회복국민협의회”(전라남도 상임대표위원), 1977년 “국제사면위원회”(전남지부 고문), 1978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가 맡았던 인권 변론들은 국회의원 유옥우의 국가원수 모독 사건(1965.), 전남대 학생회장 정동년 구속사건(1965.), ≪함성지≫ 사건(1973.), 고영근 목사 사건(1977.), <노예수첩> 필화사건(1977.),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1978.) 등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활동 경력으로 인해 홍남순은 5ㆍ18민중항쟁 국면에서도 시대적 역할을 담당했다. 5월 17일 오후 광주 YWCA에서 개최된 광주지역 인사들의 긴급 모임에 다녀온 그는 18일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19일 가족의 권유로 검속을 피해 상경했으나, 21일 어렵사리 광주로 돌아왔다. 홍남순은 22일 남동성당에서 개최된 수습위원회 구성논의에 참가했으며, 26일에는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의 도심 진입을 막기 위해 수습대책위원 17명과 더불어 ‘죽음의 행진’을 벌였다. 홍남순은 계엄당국에 연행ㆍ구속되었고, 상무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조사와 재판에서도 굴함이 없이 당당했으며, 꾸짖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홍남순은 1981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홍남순은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켰다. 그는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권 변호사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생전 활동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2017년 12월 “대인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를 결성했다. 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기반으로 광주광역시는 2017년 9월 8일 그의 생전 자택을 사적지 제29호로 지정ㆍ고시했다. 광주광역시는 사적지로 지정한 이유로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진 곳, 장소성을 갖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전개된 곳”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12월 8일 자택 앞 인도에 표지석을 설치했다.
위치
주변 사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