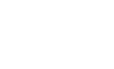광주 사적지(29개소)


상무관은 1968년 6월에 착공하여 1969년 8월에 완공되었던 ‘금남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192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 경찰이 유도를 단련하는 도장으로 만들었던 ‘무덕전’이라는 일본풍의 목조건물을 해체하고 상무관을 신축한 것이다. 전남도청 회의실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무덕전이 회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했을 때에는 연행한 학생들을 이곳에 임시 구금했다.
5·18민중항쟁에서 상무관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로 사용되면서부터였다. 계엄군이 철수한 뒤 산개되어 있던 시신들이 5ㆍ18민주광장으로 집결되었다. 이것은 시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고, 가족들이 희생자의 시신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가족들은 시신을 찾아 도심 곳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훼손된 시신들을 무수한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시신들은 22일부터 상무관에 안치되었는데, 23일 아침을 기준으로 약 30구 정도였다. 상무관에 안치하지 못한 시신들은 도청과 병원 등에 있었다. 시신들은 관이 부족하여 무명천으로 덮여 있기도 했는데, 부패 방지를 위해 방부제가 살포 되었다. 그리고 추모의 의미와 시신의 부패로 생겨난 냄새를 희석하고자 곳곳에 향이 피워졌다. 상무관은 가족들의 통곡과 오열로 넘쳤고, 탈진한 가족들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상무관앞에는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도청 민원실에서는 시신들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혈육을 찾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신들을 입관 하고 수습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일에 헌신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층민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 진압에 맞서다 유명을 달리했다. 26일경 상무관에는 더 이상 시신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상무관에 안치된 시신의 수량에 관한 증언은 제각각인데, 27일 검시를 하며 작성한 기록 등을 참고하면 60여구 이상이 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무관은 옛 전남도청과 함께 원형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위치
주변 사적지